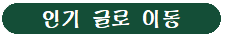"기억이 '나'를 만든다 – 흄과 뇌과학이 말하는 정체성의 진실"

1. '나'는 존재하는가? – 정체성에 대한 오래된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철학의 기초이며, 동시에 인간 존재의 본질을 겨눈 가장 깊은 탐구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기존 철학적 이론을 뒤흔든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흄(David Hume)입니다. 그는 우리가 믿는 ‘자아’라는 것이 사실은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2. 데이비드 흄의 충격: 자아는 환상이다
흄은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로, 경험주의와 회의주의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파격적입니다.
“나는 어떤 '자아'도 경험한 적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감각과 기억, 인상들의 흐름뿐이다.”
흄은 우리가 ‘자아’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는 연속된 인상(impressions)과 관념(ideas)의 모음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감각, 기억, 정서, 생각 등 수많은 심리적 상태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여 ‘지속적인 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경험의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3. 현대 뇌과학의 증언: 기억은 변하고, 자아는 조작된다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의 발견들은 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억은 끊임없이 재구성됩니다. 어떤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은 다시 쓰여지며, 왜곡될 수 있습니다. 즉, 과거는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뇌의 작업 결과물입니다.
● 기억과 정체성의 상관관계
자신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도구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변한다면 정체성 역시 안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치매 환자나 기억 상실증 환자의 경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 자아는 뇌의 서사 구조물
뇌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이 '내러티브 자아(narrative self)'는 마치 소설을 쓰듯 자신을 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편집되고 삭제될 수 있는 가변적 구조입니다.
4. '지속된 나'의 신화: 뇌가 만드는 환상
이쯤 되면 ‘나’란 존재가 뭔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나는 어제의 나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의 이야기를 편집합니다. 아침의 감정, 점심의 사건, 저녁의 기억은 모두 다르고, 그때마다 '나'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짓고 싶어 하기에, 뇌는 자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이야기’를 꾸밉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뇌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줄기줄입니다. 즉, 우리는 실재하는 ‘자아’보다는, '믿고 싶은 자아'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5. 흄과 현대 뇌과학의 만남: 철학은 지금도 유효하다
데이비드 흄은 18세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자아에 대한 통찰은 현대 뇌과학자들의 실험적 데이터와 맞닿아 있습니다. 철학이 공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오늘날 과학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과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철학 없는 과학은 방향을 잃고, 과학 없는 철학은 공허하다’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흄은 뇌과학적 실험이 없던 시대에 ‘자아가 없다’고 주장했고, 오늘날 과학은 그 주장을 점점 더 정교하게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깊게 하는 인문학, 철학 14] 베르그송과 현대 뇌과학이 말하는 기억
"왜 우리의 기억은 매번 달라질까 – 심리철학과 뇌과학이 말하는 ‘기억의 역설’" 기억은 과거의 복사본인가? – 베르그송과 뇌과학이 밝힌 기억의 진실 이런 순서로 글을 씁니다.1. 기억은 ‘
iallnet12.tistory.com
6.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더 이상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구조, 기억의 역동성, 자아 내러티브의 구성 방식이라는 복합적인 퍼즐입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시간 속에서 구성되고 해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 ‘나’를 다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정체성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가꾸는 것이라는 말이 이 지점에서 유효하게 다가옵니다.
맺으며: 나는 결국, 기억하는 나다
데이비드 흄은 '자아는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관계를 맺고, 나를 설명하려 노력하는 한, '나'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단단한 돌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순간순간을 지나며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 예고
[삶을 깊게 하는 인문학, 철학 제11편]
“시간은 존재하는가? – 하이데거와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지금 이 순간’”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현재’는 과연 실재하는가? 철학과 물리학의 대담한 통찰을 통해 시간의 개념을 다시 살펴봅니다.
출처
데이비드 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Antonio Damasio, 『나는 내가 만든다(The Feeling of What Happens)』
Stanislas Dehaene, 『의식이라는 수수께끼』
뇌과학 저널 <Neuron>, <Nature Neuroscience>
BBC Documentary “The Brain with David Eagleman”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다른 글 소개
[생활정보 제22편] 펜에 불이 붙었어요! – 주방 화재 순간 대처법
필자의 경험과 여러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요리하다 팬에 불이 붙었다면? – 주방 화재 순간 대처법 총정리"요리 중 갑자기 팬에 불이 붙었다면, 어떤 행동이 생명을 지키고, 어
iallnet.com
[상처 입은 내 마음 달래기 ⑥]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 경계선 없는 마음의 피로
필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왔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의 경험과 여러 참고 문헌을 바탕으
iallnet.com
본 글은 제작자의 경험과 참고자료 발췌 편집, 이미지 자체 제작.
'철학,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삶을 깊게 하는 인문학, 철학 제12편] 감정은 나인가? – 데카르트와 신경과학이 말하는 자아의 감정 지도 (1) | 2025.05.10 |
|---|---|
| [삶을 깊게 하는 인문학, 철학 제11편]“시간은 존재하는가? – 하이데거와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지금 이 순간’” (0) | 2025.05.07 |
| [인간의 삶을 깊게 하는 인문학, 철학 9]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칸트의 행복론 비교 (4) | 2025.05.01 |
| [인간의 삶을 깊게 하는 인문학, 철학 8] 죽음에 대한 철학 – 하이데거, 토마스 모어,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삶 (0) | 2025.04.27 |
| [인간의 삶을 깊게 하는 인문학, 철학 7] 고독의 철학 – 파스칼에서 루쉰까지, 혼자 있는 삶의 힘 (0) | 2025.04.24 |